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37460.html?_fr=gg&fbclid=IwAR2PL52BUQdqMa-eu1nyKquet3XGbGm_yjia-9AdWDmVOCIVOT1w096LXjU#cb#csidx5a1771108e77f9093b58a9985a34582
객체들의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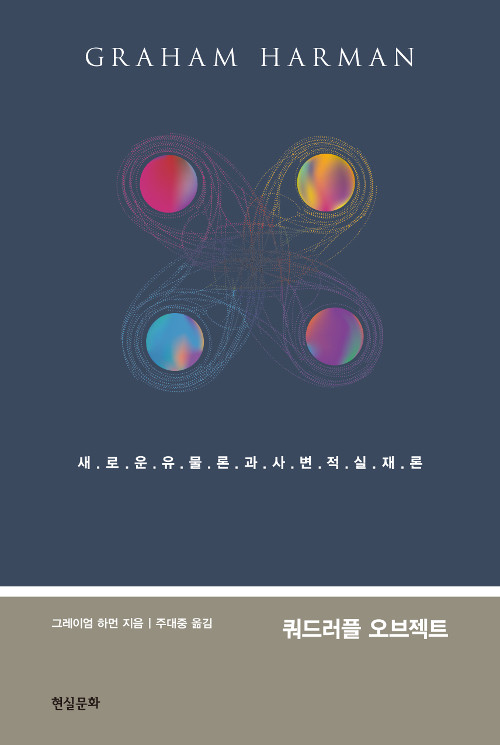
우리는 흔히 세상을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물들의 집합쯤으로 상상한다. 나와 나를 둘러싼 강, 산, 나무, 책, 노트북. 이 모습을 단순화하면, 나를 포함한 인간 주체와 대상인 객체들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 주체-객체 모델은 우리 사고를 지배해 온 오랜 형식이다.
그러나 인간과 세계 두 극점으로 이루어진 이 모델은 모든 문제를 어느 한쪽으로 축소해 버린다. 이를테면 관념 철학처럼 객체를 마음에 구르는 감각객체로 제한하거나, 거꾸로 과학주의처럼 무생물 객체를 전면에 내세워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거부하도록 이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사유 너머에 있는 실재를 은폐하거나, 세상을 단지 물리적 충격으로만 보고 철학적 질문을 소거해 버린다. 존재론이 퀭한 지하도처럼 텅 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도 어느 한쪽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레이엄 하먼은 객체를 철학의 영웅으로 삼아 ‘객체 지향 존재론’의 무대에 올린다. 이 배우들은 언제나 객체-성질 듀엣으로 올라 박진감 넘치는 연기를 펼친다.
책을 예로 들어보자. 책은 겉보기에 움직임도 소리도 없지만,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특성들로 뒤덮여 있다. 접히고 찢기며, 심지어 종이는 썩어가고, 활자는 옅어져 간다. 이처럼 책이라는 감각 객체와 흰 종이, 검은 활자로서 감각 성질은 서로 짝이 되지만, 동시에 둘 사이에 ‘시간’이라는 긴장이 감돈다(감각 객체-감각 성질).
그러나 끊임없이 감각 성질이 변해도 여전히 책은 책이다. 접히고, 찢기고, 썩어도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책으로 여긴다. 그것을 책답게 해주는 책 자체의 실재 성질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책-감각 객체와 책을 책답게 해주는 책의 실재 성질들(예컨대 책의 의미/구조) 사이에 ‘형상’이라는 긴장이 펼쳐진다(감각 객체-실재 성질). 실재 성질은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이른바 예술이나 과학의 암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닿을 따름이다.
그렇다고 책의 실재 성질들이 객체 없이 붕붕 떠다니지는 않는다. 위성인 달이 주인인 지구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처럼, 그것은 자기가 속하는 실재 객체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이때 책은 검은 활자, 흰 종이 묶음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경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책 자체, 바로 사유 너머에 있는 실재(예컨대 언표 이전의 책)에 속한다. 실재 객체로서의 책과 실재 성질들 사이의 긴장을 우리는 흔히 ‘본질’이라고 불러 왔다(실재 객체-실재 성질).
경험의 왕국에서 물러난 실재 객체가 실재 성질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책 그 자체로서 실재 객체는 검은 활자와 흰 종이 묶음이라는 감각 성질을 게워낸다(실재 객체-감각 성질).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실재 영역과 감각 영역이 서로 살 비비며 이종교배를 이루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먼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을 ‘공간’이라고 불렀다. 그러고 보면 모든 감각의 장소는 이종교배의 공간이다.
자, 이제 객체 아닌 것은 없다. 주체도 상황에 따라 저 객체 중 하나에 위치한다. 황제인 주체 주위에 객체들이 신하처럼 고개 숙인 모습은 사라진다. 황제가 내려와 신하들과 함께 선다. 주체는 객체의 위치로 돌아가 자리 잡고, 주체와 객체의 위계는 파괴된다. 바야흐로 객체들의 민주주의가 울려 퍼진다.
<자기배려의 책읽기> 저자, 철학자


'■ [한겨레ㆍ책과 생각] 강민혁의 자기배려와 파레시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 가라타니 고진 (0) | 2020.06.14 |
|---|---|
|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 마르틴 하이데거 (0) | 2020.05.15 |
| 역사유물론 연구 - 에티엔 발리바르 (0) | 2020.03.20 |
| 선악의 저편 - 프리드리히 니체 (0) | 2020.02.21 |
| 일탈 - 게일 루빈 (0) | 2020.01.24 |





댓글